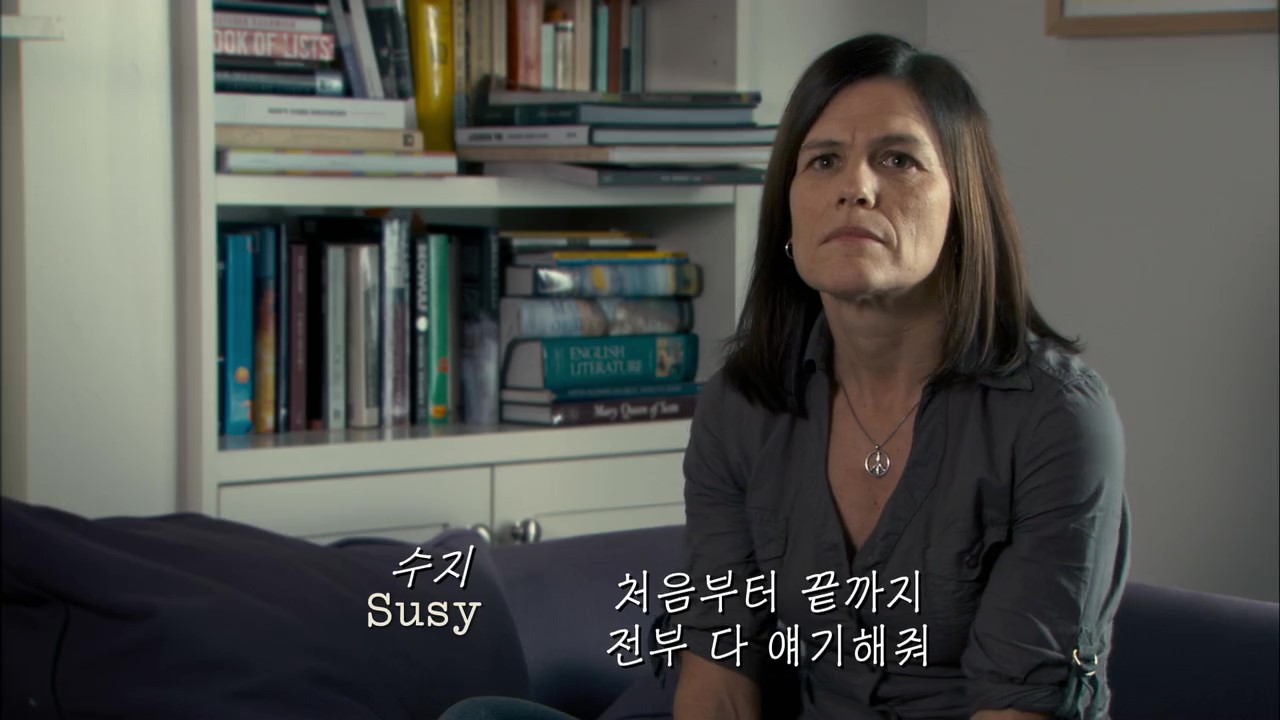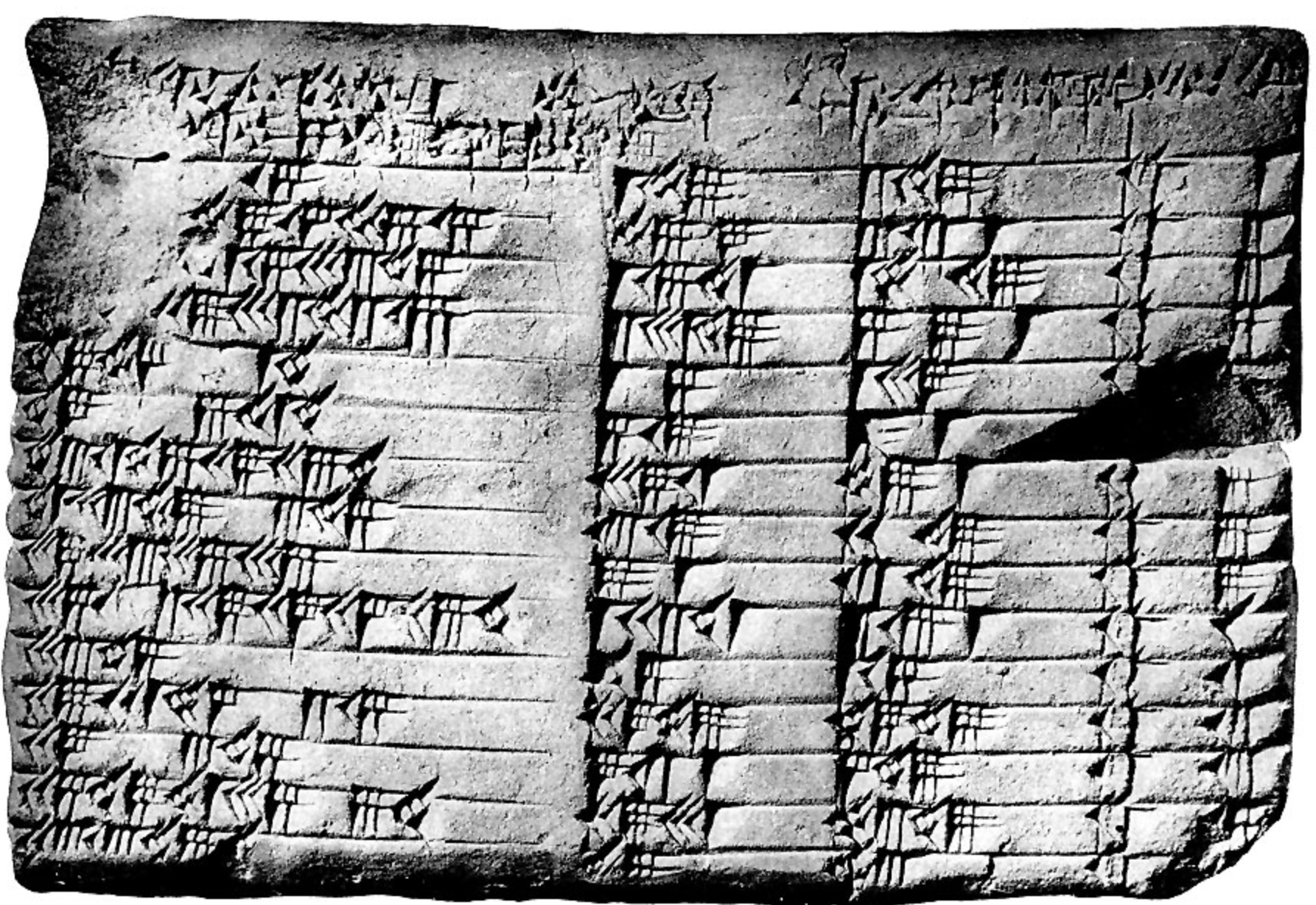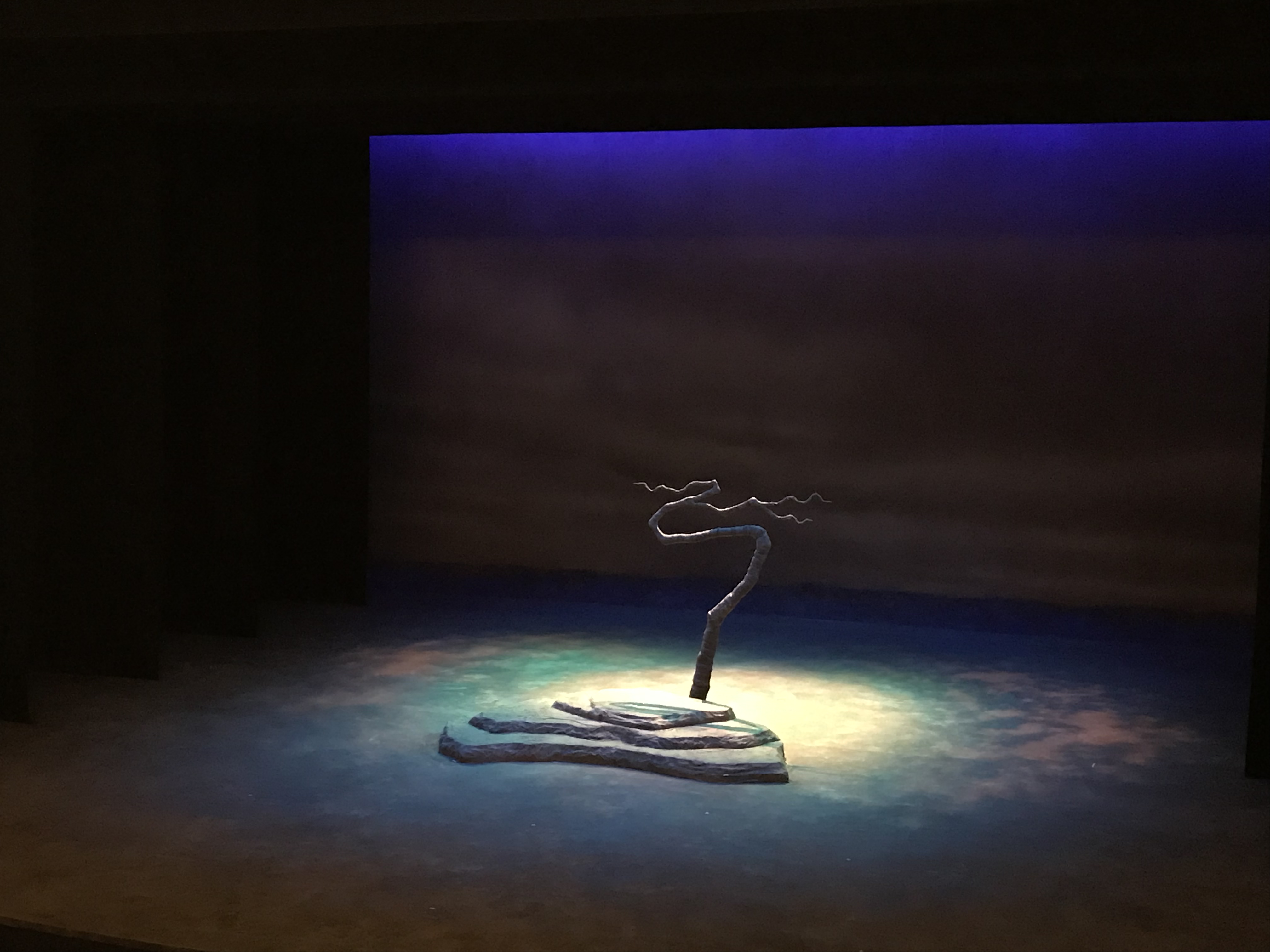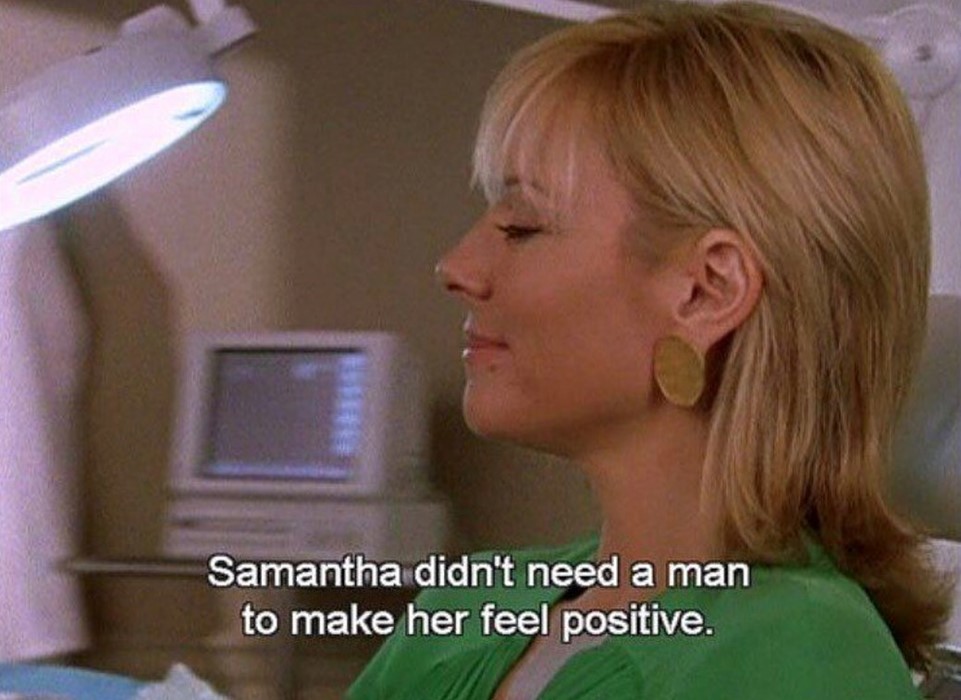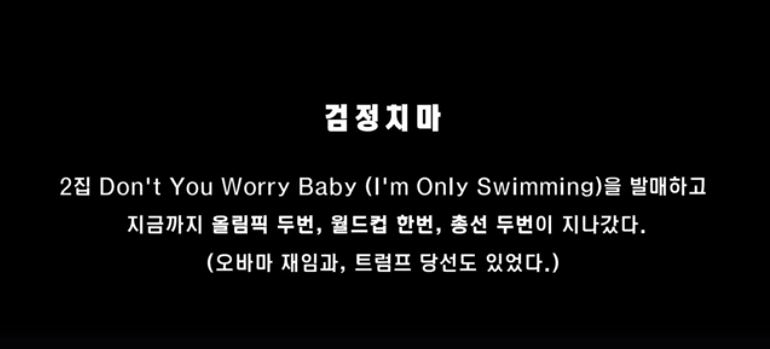‘이달’의 소녀, 이 ‘달’의 소녀 : ‘루나버스’를 통해 살펴본 아이돌 세계관의 딜레마
선데이빽
지금부터 나는 아주 황당한 사실 하나를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먼저 TV를 켜고, 무엇이든 좋으니 당신이 아는 음악방송 중 하나를 틀어보라. (TV가 없다면 유튜브의 K-pop 섹션에 들어가도 좋다.) 아마 당신은 ‘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들 어디에 숨어있었나’ 싶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아이돌 친구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면면을 찬찬히 한 번 살펴보라. 왜냐하면 그들 중 상당수는 사실 사람이 아니거든.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고? 아니, 이건 사실이다. 당신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노래는 사실 태양계 외행성으로부터 날아온 외계인들이 부른 것이고, 화면 속에서 웃으며 춤추고 있는 그 소녀들은 한때 황도 12궁의 별자리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마법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서로의 꿈을 매개로 이어져 ‘네가 나고, 내가 너인’ 상태에서 무한히 확장하는 미지의 소년 무리도 있다. 아, 하나만 더 귀띔하자면 몇 년 전 거리에 널린 통신사 대리점들의 입구를 장식했던 그 입간판의 주인공 역시 실은 날개를 숨긴 천사다. 내 지독한 허언에 속이 울렁거려 이 장을 얼른 스킵하더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이건 말도 안 되는 허언, 음모론이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비밀들은, 모두 각자의 회사에서 대외적으로 공인한 사실이니까.
작금의 K-pop 트렌드는 누가 뭐래도 ‘세계관’과 그에 따른 ‘n부작’ 시리즈이다. 반도를 휩쓴 후크송 열풍에 너나할 것 없이 ‘용감한’ 그분, ‘신사동’ 그분, 혹은 그밖의 히트송메이커들을 등에 업고 단발적인 흥행만을 노리던 그 언젠가의 기획 방식에 비교하면, 아이돌 음악은 분명 진화해도 한참 진화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디스코그래피 내의 유기성을 견고히 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세계관’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서 비롯된 궁극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음악과 안무의 차원을 넘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특정한 내러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곡들 간의 연관성과 당위를 밝히려는 시도인 것이다.
물론 결코 그 수가 얄팍해서는 안 된다. 월드와이드를 향해 뻐렁차게 달려 나가고 있는 BTS는 물론 NCT, 이달의 소녀, 우주소녀, 여자친구, 온앤오프, 드림캐쳐, 원어스 등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 수많은 아이돌 팀들이 모두 저마다의 크고 작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는 분명 야심차게 벌여놓은 판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무너지고야 마는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이 구축한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방대하다. 모종의 이유로 위기에 빠진 멤버들이 서로를 구해내고 갈등을 해소하는 애처로운 스토리는 이미 클리셰가 된지 오래이며, 마법, 우주, 초능력과 같은 판타지적 요소의 개입도 이제는 예삿일이다. 그리고 길어야 10분을 넘지 않는 뮤비에는 도저히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었는지, 세계관은 이제 콘서트의 VCR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새로운 형태의 비주얼 필름(각주 : NCT의 ‘NCTmentary’ 시리즈.)으로, 그리고 웹툰을 비롯한 각종 2D 컨텐츠(각주 : BTS의 ‘화양연화 Pt.0 ’.)로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단언컨대 이는 새 시대에 걸맞는 ‘진화된 형태의 떡밥’이다. 뮤비와 화보에 등장하는 각종 오브제들을 발견하고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의미를 팬들끼리만 유추하던 고릿적 추억을 넘어서서, 회사는 본격적으로 ‘판’을 짜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수많은 예시들을 보라.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컨텐츠를 던져주고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친히 떠먹여주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뭇 팬들의 텍스트뷰어를 가득 채웠던 각종 2차 창작물이 이제는 회사의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잠깐. 제가 좀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그러니깐 이게 지금 다 아이돌 얘기라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는?” 물론. 소설을 써도 몇 편은 썼을 이 어마어마한 서사들은 분명 모두 아이돌의 컨텐츠이다. 그리고 그들의 본업이 재담꾼, 혹은 연극배우가 아닌 이상, 이는 어디까지나 음악에 덧붙는 일종의 ‘도움말’에 지나지 않는다. 닭과 달걀, 혹은 배와 배꼽의 관계, 여기서는 따지지 않기로 하자.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K-pop 씬이 이 거대한 세계관의 그림자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 ‘이달의 소녀’가 있다. ‘루나버스(LOONAverse)’라는 독자적인 명칭까지도 보유한 이 팀의 세계관은 ‘달’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오드아이, 안드로이드, 뫼비우스, 차원이동은 기본이요, ‘에덴’이라고 불리는 천상계의 영역에까지 나아가 신, 성경, 금단의 사과, 사랑과 우정, 배신과 질투 등 세계관에서 등장할 수 있는 소재란 소재는 죄다 다루고 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이와 같은 방대한 세계관을 확립해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팬들은 여전히 새로운 떡밥을 갈구하고 있고, 제이든 정(각주 : 이달의 소녀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A&R.)이 마구 흩뿌려놓은 단서들을 이리저리 조합해 그 의미를 유추하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어디까지가 기획자의 본래 의도였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미지의 세계관에 열중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조는 덤이고.)
이 루나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들의 ‘99억짜리’ 초대형 데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달의 소녀는 ‘매달 1명씩 새로운 멤버를 공개한다’는 독특한 컨셉의 프로모션을 통해 데뷔한 12인조 그룹이다. 또한 이 12명의 멤버들은 다시 3개의 유닛(각주 : 이달의 소녀 1/3, 이달의 소녀 오드아이써클, 이달의 소녀 yyxy.)으로 쪼개지는데, 특이하게도 이달의 소녀는 본격적인 완전체 데뷔 이전에 유닛 활동을 선행했다. 덕분에 팀의 정식 데뷔까지 자그마치 1년 10개월이 걸렸으며, 각각의 솔로 앨범, 유닛 앨범과 리패키지, 그리고 그 밖의 스페셜 앨범을 포함하여 데뷔 이전에 발매한 공식 앨범만 18장이 넘는다. (여러모로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기획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루나버스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애초에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요약이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정말 추리고 추리자면 루나버스는 ‘12명의 소녀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서 언급한 3개의 유닛들은 각기 다른 세상, 즉 1/3은 지구, 오드아이써클은 중간계, 그리고 yyxy는 ‘에덴’이라 불리는 천상계에 존재한다.(각주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yyxy는 한때 ‘에덴’에 있었지만 모종의 이유들로 지구에 추락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있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무한히 반복되는 뫼비우스의 굴레에 속박된 탓에 어설픈 탐색의 시도마저도 늘 실패에 그치고야 만다. 하지만 어느 날, 오드아이써클이 가장 먼저 무언가를 깨닫는다. 한 쪽 눈의 색깔이 변하는 이 3명의 소녀들은 서로의 영향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각성하게 되며, 뫼비우스를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한 자리에 모여 본격적으로 다른 소녀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먼저 차원 이동 능력을 지닌 멤버 최리가 에덴과 지구를 오가며 나머지 멤버들의 각성을 돕고, 새롭게 각성한 소녀는 오드아이써클과 함께 또 다른 소녀를 돕는다.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을 통해 12명의 소녀들은 마침내 서로를 모두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데뷔곡 가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관한 곡이다. (각주 : 본 글에서는 루나버스의 A to Z에 대한 이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원한다면 차라리 나무위키에 들어가보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며, 사실은 필자도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이달의 소녀의 영문명은 ‘LOONA’이다. 그리고 본 글의 제목처럼 ‘이달의 소녀’라는 이름은 ‘이달(this month)’와 ‘이 달(this moon)’,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루나버스에서 ‘달’이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떠올려본다면, 우리는 이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세계관을 전제하고 출범한 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어디 그뿐이랴. 정규 데뷔 전부터 수차례 진행한 ‘상영회’는 뮤비와 부가영상에 대한 감상과 해석을 대놓고 유도하는 자리이고, 자체 컨텐츠인 ‘이달의소녀탐구’(각주 : 멤버들의 일상을 담은 짤막한 영상 시리즈로, 유튜브의 공식 채널을 통해 업로드된다.)에서도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세계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술한 루나버스가 더 이상 팬들끼리만 공유하는 허무맹랑한 추측이 아니라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단서’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연출된 메타포이며, 회사에서도 분명 이 장대한 픽션을 써내려가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달의 소녀는 너도 나도 뛰어든 이 세계관 열풍 속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이를 전개해나갔던 팀들 중 하나이다.(각주 : 굳이 과거형을 쓴 이유는 데뷔 전까지의 전투적인 화력과는 달리, 지난 활동 이후로 회사에서는 그 어떠한 떡밥도 던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저 근데요, 그래서 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솔직히 그 세계관이라는 거, 말해주기 전까진 전혀 모르겠거든요.” 당장 지금도 다음 스토리를 구상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누군가는 대번에 힘이 빠지겠지만, 사실은 아주 예리한 지적이다. 물론 루나버스가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 구축에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십분 인정한다. 실제로 세계관은 새로운 ‘유입’을 불러일으키기에 꽤 괜찮은 미끼니까. 어느 정도의 항마력만 있다면야 이 ‘12소녀 판타지물’은 분명 흥미로운 컨텐츠이고, 순수하게 그 내용이 궁금해서 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버린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필자 본인의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아는 사람 얘기이다.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작업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즐거운 게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바로 세계관이 어디까지나 철저히 서브컬쳐라는 사실이다. 바다 속에 전복과 새우가 차고 넘쳐봤자 뭍사람의 몸을 적시는 노력 없이는 찜도 구이도 없다.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수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애초에 이 소녀들의 절절한 사연에 대해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금의 루나버스는 어지간한 관심과 노력 없이는 절대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멀리 와버렸다. 이는 루나버스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세계관을 자랑하는 EXO처럼 어마무시한 화력이 뒷받침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쉽게도 이달의 소녀의 현 위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연 문제라면 문제이다.(각주 :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이달의 소녀가 폐쇄적인 걸그룹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놀랍게도 실제로 한 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걸그룹이 철저히 대중성을 타깃으로 기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참신하고 도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관에 대해 그닥 알고 싶지 않아 한다. 이 글의 첫 문단만 읽고도 손발이 뒤틀려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을 수많은 누군가들을 기억하자. 집에서 밥 잘 먹고 건강히 자란 성인이 사실은 안드로이드이고, 초능력자이고, 태양을 삼킨 죄수라니. 멀리서 보면 그저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이 ‘세계관 놀음’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사람은 분명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알고 보면 엄청난 ‘진입장벽’인 셈이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달의 소녀가 직면한 또 다른 난관은 앞으로의 행보가 그들의 세계관에 묶여있다는 사실이다. 팀의 근원적인 정체성부터 이미 철저히 루나버스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발표하게 될 곡들 또한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곡은 이제까지 펼쳐온, 혹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서로서 만들어져야 하고, 선택되어야 한다. 그저 ‘듣기에 좋은’ 곡을 발굴해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하물며 부수적인 스토리를 짜내고, 각각의 곡과 뮤비를 그 내용에 끼워 맞추어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이 접하기에도)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선보인다는 것이 과연 말처럼 간단할까. 더군다나 루나버스는 한시적으로 반짝 고생하고 해치워버릴 수 있는 ‘n부작’ 프로젝트도 아니다. 결국 이달의 소녀가 지금의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다시 말해 좋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각종 세계관 떡밥을 함께 뭉쳐서 던져주려면, 반드시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의 품을 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미 야심차게 루나버스를 선포해버린 이상, 이는 멋진 족쇄가 되어 오래도록 그들의 걸음을 무겁게 할 것이다.

이건 비단 이달의 소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관 열풍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질의 컨텐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내가 ‘결코 그 수가 얄팍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내러티브의 짜임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드러내는 컨텐츠 자체의 퀄리티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계관은 절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치밀한 서사 구조는 물론이요, 감상자들의 높아진 안목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교한 수준의 음악과 비디오,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우랴. 컨텐츠가 무슨 박 속에서 뚝딱!하고 나오거나 착한 황새가 냉큼 물어다주는 거라면 퍽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결국 컨텐츠는 전적으로 회사가 지닌 역량의 문제인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혹은 영혼을 갈아 넣는 기획력?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부내 나는 사운드를 자랑하는 EXO의 음악, 뮤직비디오보다도 더 공들여 제작한 것만 같은 NCT의 세계관 영상, 시작부터 호쾌하게 99억을 쏟아 부은 이달의 소녀의 데뷔 프로젝트. 요컨대 ‘때깔 좋은’ 컨텐츠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본을 필요로 한다.
앨범, 뮤직비디오, 안무, 홍보, 헤메스, 식대, 숙소,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등. 아이돌 프로듀싱에 있어 돈 나갈 구멍은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 창구가 확보된 대형기획사야 뭐가 무섭겠느냐마는, 중소기획사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익히 알려져 있듯 대부분의 아이돌이 빚더미 위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어느 회사 대표는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노래를 받기 위해 월세 집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까지 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그런가하면 활동을 지원해줄 돈이 없어 음악방송 한 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뒤안길로 사라진 팀은 또 얼마나 많았나. 이것이 바로 중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웬 역할놀이에까지 돈을 써야 한다니. 뒤에서 쫓아가는 것도 버거운 그들에게 이 ‘반(半)음지문화’의 유행은 너무나도 가혹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으려면 시류에 따라야하지만, 높은 문턱 앞에서 어설픈 도전은 또 다시 바스러지고야 만다. 세계관의 딜레마란 이토록 눈물겨운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음악 산업 내의 소비가 대부분 아이돌 시장에 쏠려 있음은 자못 분명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돌 음악에 대한 기대는 끝을 모르고 커져가는 중이다. 예컨대 최근 몇 년 새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자체 프로듀싱’ 타이틀만 봐도 그렇다. 춤과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아이돌은 작사/작곡까지 잘하는 짱짱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세계관 열풍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K-pop이 단순히 듣고 즐겁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호시절은 한참 지났다. 더 무겁게, 더 심오하게, 더 거창하게. 동시대 아이돌 음악의 방향성을 정리하자면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음악은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대중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결국 생존의 전략은 또 한 번 바뀌게 되었다. 리스너, 특히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코어 팬덤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면에 대단한 의미를 숨겨둔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필요하다. 세계관은 전적으로 회사의 역량에 달려있고, 역량의 다른 말은 곧 자본이다. 하지만 개천은 이미 오래 전에 말랐으며, 용이 떠난 그 자리에서 뱁새는 이제 다리를 찢다 못해 뜯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왕관을 쓰는 자는 누구이고, 무게를 버텨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별안간 들이닥친 세계관 열풍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PEEP VOL.04 [2019-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야기를 통해 삶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 Stories We Tell 영화 리뷰 (0) | 2019.10.08 |
|---|---|
| 신촌에는 꿈틀거리는 검은 큐브가 있다 - 신촌 극장에서 올려진 세 개의 공연을 보고 (0) | 2019.10.08 |
| 나는 왜 작곡을 하는가 (0) | 2019.10.08 |
| 내가 모르는 용기 : 영화 <한공주>에 관하여 (0) | 2019.10.08 |
| 당신이 알려준 기다리는 법 - 임영웅 연출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고 (0) | 2019.10.08 |